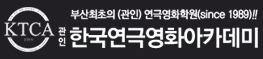배우 앞에 ‘국민배우’ ‘믿고보는 배우’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는데, 자신에겐 그렇게 설명할 수식어가 없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저에겐 떠오르는 수식어가 없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외모가 예쁘거나, 연기를 소름 끼치게 하는 것도 아니죠.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친구 같은 배우’입니다. 친구는 갑자기 삐질수 있고, 갑자기 잘 해줄 수도 있잖아요 . 편한 친구를 대하듯 절 보고 ‘어 잘 했는데’란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해요.”
|
그의 바람대로 그는 ‘기생충’ 이후 선택한 영화 ‘니나 내나’에서 대중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생충’이 개봉하기 전 ‘니나 내나’ 촬영을 마쳤다. 그는 “‘니나 내나’는 ‘기생충’ 개봉 전에 촬영했고, 작품을 끝내고 휴식 같은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어요. 찍으면서 부담감이 없었고 마음의 안정이 됐어요. 제 스스로 많이 회복한 시간이었다”고 털어놨다.
영화 ‘니나내나’는 오래전 집을 떠난 엄마에게서 편지가 도착하고, 각자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삼 남매가 엄마를 만나기 위해 여정을 떠나며 벌어지는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그린 이야기.
장혜진은 삼 남매 중 장녀 미정 역을 연기했다. 예식장에서 일하며 홀로 중학생인 외동딸 규림을 키우며 살고 있는 미정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성격으로 누구보다 가족을 끔찍이 여기지만 가족을 버리고 떠난 엄마에 대한 상처와 원망은 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시나리오를 봤을 때 너무 힐링 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내 이야기 같고, 내 친구 이야기 같고, 주변의 이야기 같고, 우리 엄마 이야기 같고, 내 딸의 이야기 같기도 한 친근함이 너무 좋았어요. 남 이야기 같지 않고 내 이야기 같잖아요. 또 사건들이 특별하게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큰딸 미정은 가족을 끔찍히 아낀다. 집나간 엄마를 애증하는 한편, 동생들에게 엄마 역할을 대신하며 살아왔다. 우리가 흔히 보아온 큰 딸의 모습은 아니다. 허당 같은 매력으로 ‘미정’의 캐릭터를 풍성하게 만든 장혜진은 미정이란 인물의 내면에 대해 공감했다.
장혜진은 미정을, “어릴 때 자기 이름이 너무 싫었다고. ‘미정이만 없었다면 헤어졌다’는 부모의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의 상처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이 철없어 보이는 미정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고 연기했음을 밝혔다.
힘들지 않은 척, 애써 노력하는 미정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영화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이다. 장혜진은 “부족함이 있고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라 더 눈길이 가고 마음이 쓰이고, 쓰다듬어 주고 싶었다”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또한 “가족 때문에 힘든 게 아닌, 가족 덕분에 괜찮아란 의미로 들리는 점이 매력적인 영화이다”고 전했다.
“‘니나 내나’는 사람이 죽고 난 뒤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 스스로 치료하는 의미도 담겼어요. 가족 때문에 힘들었고 상처도 있지만 다시 가족으로 치유받는 이야기이죠. 징글징글하다가도 사랑스럽고, 꼴 보기 싫다가도 보고 싶은 게 가족이죠. 결국 가족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른 자아들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더 단단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
|
|
영화 제목인 ‘니나 내나’의 의미 역시 심플하게 설명했다. 그는 “‘힘을 내라’ 고 푸시하는 말이 아닌, 사는 게 너나 내나 비슷하니 오늘도 ‘수고했어’ 란 의미로 토닥 토닥 해주는 작품이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1기 출신으로 시작해 1998년 영화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에 출연하며, 배우 활동을 이어온 장혜진. 그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거치며 잠시 연기 활동을 쉬어왔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2007)으로 다시 연기에 복귀했고, 2016년 영화 ‘우리들’을 통해 봉준호 감독의 러브콜을 받으며 ‘기생충’으로 호평을 받았다.
‘기생충’ 출연 이후 달라진 건 없다고 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시나리오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차기작으로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독립 영화 ‘애비규환’ 등 다양한 작품이 시청자와 관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장혜진은 주목 받는 걸 원치 않았다. 주목 받아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려다보면 배우로서 힘들 때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늘 좋은 것도 아니고, 늘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닌 ‘친구’같은 배우로서 그렇게 늘 대중 가까이에 자리하고자 했다.
“아직은 보는 분들에게 제가 낯선 배우라는 것을 알아요. ‘기생충’ 층숙으로 기억해주셔서 감사해요. 길거리 지나가면 아무도 못 알아봐서 더 좋아요. 호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 연기가 굳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해요. 특별한 기대말고 많이 봐주셨으면 하죠. 대중들의 그 주목을 감사하게 풀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잘하고 싶은 욕심을 놔버리니까 연기가 재미있어지고 즐거워지는 게 커요. 계속 그렇게 하고싶습니다. 관객 분들도 저를 친구처럼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양문숙 기자]
/정다훈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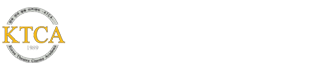
![[인터뷰] 장혜진, “‘니나 내나’ 가족 덕분에 괜찮아‘ 느꼈으면..”](https://newsimg.sedaily.com/2019/11/19/1VQUY31V4Z_1.jpg)
![[인터뷰] 장혜진, “‘니나 내나’ 가족 덕분에 괜찮아‘ 느꼈으면..”](https://newsimg.sedaily.com/2019/11/19/1VQUY31V4Z_2.jpg)
![[인터뷰] 장혜진, “‘니나 내나’ 가족 덕분에 괜찮아‘ 느꼈으면..”](https://newsimg.sedaily.com/2019/11/19/1VQUY31V4Z_3.jpg)